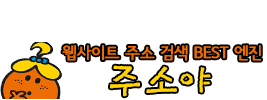형수야 내 형수야! - 2
형수야 내 형수야! - 2
그녀는 출발 전에 저에게 각방을 쓰자고 제안을 하였고 일단은 그녀의 말에 동조를 하였습니다. 그녀는 자기의 카니발을 가져가자고 하였고 저는 저의 애마인 에스페로를 가져가자고 우기던 끝에 제 차로 가기로 하였습니다. 그녀의 말인 즉은 피서철이라 방이 없으면 자기의 카니발 안에서 잔다고 하였고 저는 얼마든지 방이 있는데 구태여 큰 차를 몰고 갈 필요가 없다고 고집을 한 끝에 제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. 저와 그녀가 교대로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. 그녀가 운전을 하면 슬며시 그녀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기만 하여도 그녀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노려보는 통에 더 이상 터치를 못 하였습니다. 제 생각에 걸려든 물고기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따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였는데 물거품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. 완급을 조절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금은 초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. 짧은 연애 지식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자 마음은 더 급하여 졌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을 하여서도 도저히 생각이 안 떠올라 마음걱정이 앞서는데 "유나 삼촌, 방부터 잡아요"하기에 "이제 유나 삼촌이라 안 부를 때가 안 되었소?"하고 묻자 "그럼 혁수씨 방부터 잡아요"하고 웃기에 "그래요 진하씨"하고 그 때부터 저와 그녀는 주위의 여관과 모텔을 이 잡듯이 하였으나 정작 방이 두 개가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. 또 있다 한들 하나에 이십 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자 그녀는 두 손 두발을 들고 저를 끌어내었습니다. 이 박을 계획하고 왔는데 방 값만 사십 만원. 여자간에 그런 큰돈을 쓰는 것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. 민박을 찾기로 하였습니다. 민박 역시 한철 장사라 두 개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. 그도 일박에 십 만원. "혁수씨 안 되겠어요, 우리 경찰서나 파출소 부근에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자요"하는 그녀의 말에 "차라리 길바닥에 누워 잤으면 잤지 차안에서는 못 자요"하고 능청을 떨자 "그럼 어떡해요"하기에 "방 하나 잡아 진하씨가 자고 저는 솔밭에서 신문지 깔고 잘게요"하자 "그럼 혁수씨가 방에서 주무시고 전 차에서 잘게요"하였습니다. 그녀가 바로 저에게 힌트를 준 것입니다. 조금 외진 곳에 모텔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가격도 민박수준이라 안성마춤이고 또 산골 초입이라 밤이면 동물이나 새들의 울음이 그녀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는 구실깜이 된다는 생각을 하자 "그럼 아까 그 모텔로 갑시다"하자 "그래요"하고는 그 모텔로 가 방 값을 주고 다시 바닷가로 택시를 타고 나와 횟집에 들어가 금값처럼 비싼 회와 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다정하게 바닷가를 거닐며 밤이 깊어지자 택시를 타고 그 모텔로 갔습니다. 모텔에 도착을 하자 차에서 짐을 가지고 내려 안으로 들어가기에 따라 들어가자 "저 샤워하고 나올 동안 밖에서 기다리세요"하고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. 참 기가 차데요. 한참을 차 옆에서 기다리자 나오더니 "자, 키, 편히 주무세요"하고는 방의 키를 저에게 주고 차의 키를 받더니 차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더니 "들어가세요"하고 차창을 조금 열고 말하였습니다. "알았어요"하고 방으로 올라가 밑의 차를 바라보았습니다. 먼 산에서 산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자 간이 크다고 생각을 한 저도 더럭 겁이 났습니다. 한참을 제 차를 보고있는데 차 문이 열리며 그녀가 모텔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. <걸렸다>하고 쾌재를 부르며 모든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. "똑!똑! 혁수씨, 혁수씨"하고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"왜요?"하고 문을 열지 않고 묻자 "무서워요 어서 문 열어요"하기에 "여기가 더 무섭습니다, 차에서 주무세요"하고 말하자 "왜요? 어서 문 열어요"하기에 "전 알몸이 아니면 잠을 못 잡니다"하고 말하자 "........"아무 대답이 없더니 "또각 또깍"하고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얼른 창가에 커튼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. 그녀가 차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양손에 얼굴을 묻고 다시 모텔 안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"어서 문 열어요 혁수씨, 쾅~쾅"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. "안이 더 무섭다 하니까요"하자 "그래도 좋아요, 어서 어서"하며 소리쳤습니다. "들어와요"하고 문을 열자 제 품으로 파고들며 "무서워요"하고 훌쩍였습니다. "이제 무서워 마요"하고는 힘주어 엉덩이를 잡아당기자 "아~흑 나 몰라"하며 얼굴을 외면하였습니다. "찔컥.. 타다닥 찔컥...퍼버억!! 타다닥...찌꺽...타..타..타..탁...타탁.."힘찬 저의 펌프질은 끝이 없었습니다. "혁수씨 나 몰라! 몰라!"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. "좋아?헉!헉"하고 땀을 흘리며 묻자 "어머 혁수씨 이마에 땀 좀 봐"하더니 머리맡에 있던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씻어주며 "이렇게 하는데 안 좋을 사람 어디 있어"하고 눈을 흘기더니 "어머머 또 올라 오른단 말이야, 아~악 나 죽어"하고 제 어깨를 잡고 엉덩이를 마구 들썩였습니다. 드디어 저도 종착역이 보였습니다. 마지막 피치를 가하여 펌프질을 한 끝에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좆물을 그녀의 보지 깊숙이 쌌습니다. "으~~~~~~" "어머 혁수씨 나 지금 배란기란 말이야"하며 울상을 지었습니다. "후~후! 결혼 안 한 선생님의 남산만한 배 볼만하겠다"하고 웃자 제 어깨를 꼬집으며 "몰라 자기가 나 책임져"하며 눈을 흘겼습니다. 그리고 작년 가을 유나의 담임선생과 결혼을 하였습니다.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얼마 전에 저의 큰 형수가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. 큰 형수의 간병은 남자가 하기에는 곤란하여 누나나 형수 그리고 집사람을 비롯한 여자들이 하기로 하고 우리 남자들은 틈만 나면 병원으로 가서 돌아가신 어머님 역할을 거뜬하게 하신 형수님의 병 문안만 할 따름이었습니다. 형수의 수술이 원만하게 끝이 나자 우리 형제들은 모두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빠른 쾌유만을 바랐습니다. 중 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자 형수님의 친구 분들도 많이 병 문안을 왔습니다. 그 중에서도 형수님과 강장 절친한 은비 엄마라는 사람은 제가 형님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제가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였던 아주머니였습니다. 그 날도 회사의 일을 마치고 형수가 입원을 한 병실로 갔습니다. 마침 그 날은 제 아내가 형수의 간병을 밤 세도록 하는 날이었습니다.